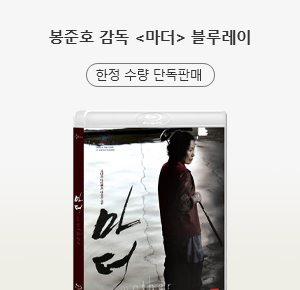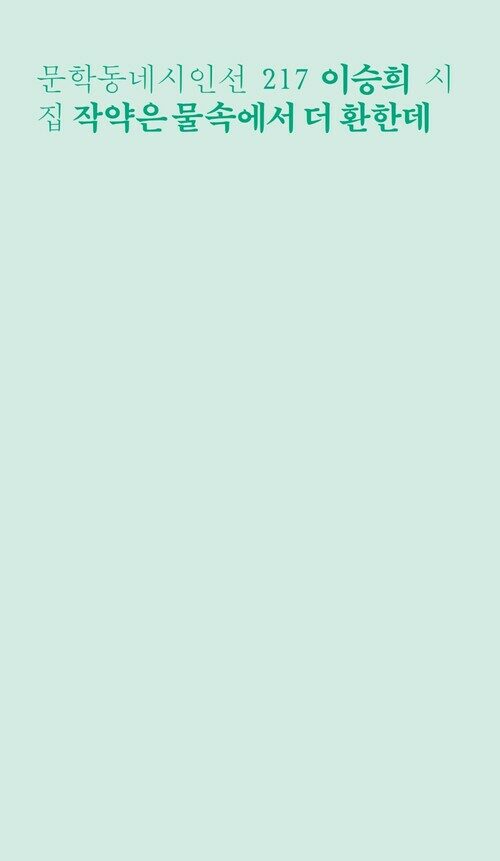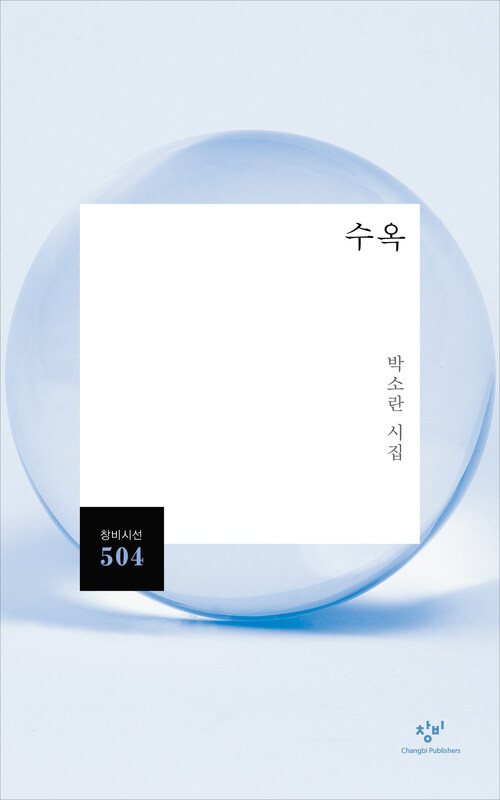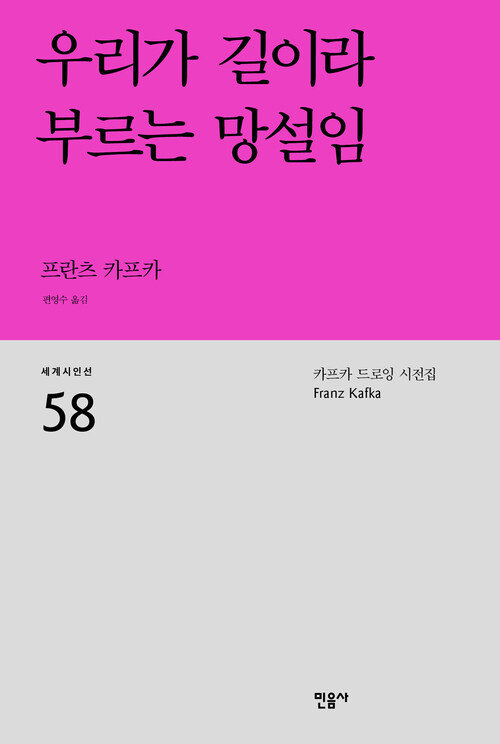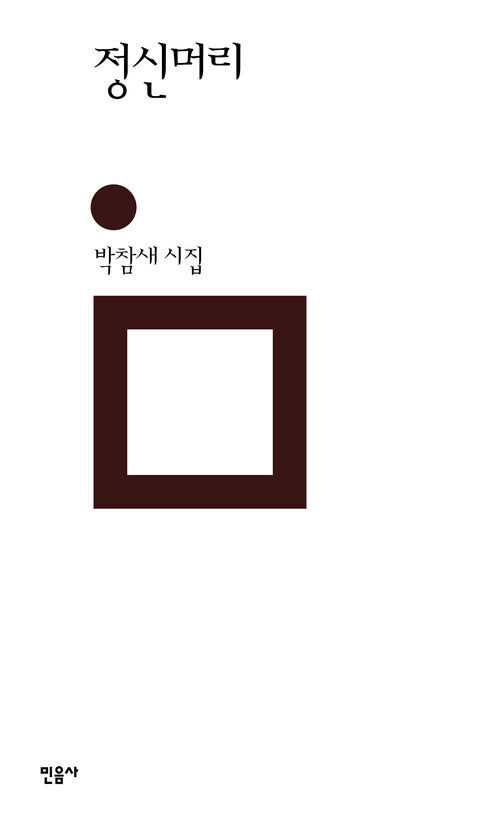한 달 한 권
11월의 시집
-
‘어디야?’ 그에게서 메시지가 온다. 이 세 글자와 물음표가 있으면 그다음엔 장소들로 이어진다. ‘어디야?’ ‘경의선 숲길을 걷고 있어.’ 답을 하고 고개를 드는데 그가 내 앞에서, 내 쪽을 향하여 걷고 있다.
경의선 숲길을 걷고 있어
<당신 집에서 잘 수 있나요?> 그 이후
도시 산책자가 보고 느낀 풍경을 간결한 언어로 빚어낸 시들에 느슨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두 사람의 우정을 그린 에세이를 한 편을 더했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실에 구속당하지 않는 시. 김이강의 시에서 서사의 객관적 진실은 중요치 않다. '진실 아님'은 '거짓'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네가 너인 것을 알면서/천사라고 생각해"라며 너를 천사로 오해하고 싶어하는 진심을 말하고 "죽은 애들이 뛰어 노는 것"을 보며 "믿기지 않아서 더 강렬하게 믿을 수밖에" 없다는 착각을 고백한다.
이처럼 다양한 오해와 착각의 스펙트럼이 때로는 하나의 진실보다 진심에 더 가깝게 닿는 순간이 온다고 믿으며.이 달의 추천 시집
이 달의 시집 함께 읽기
이 달의 시집 <경의선 숲길을 걷고 있어>를 읽고 자유롭게 댓글을 남겨 주세요. 추첨을 통해 30분께 전자책 전용 적립금 1천원을 드립니다.
- 이벤트 기간 : 11월 1일 ~ 11월 30일
- 당첨자 발표 : 12월 6일 (14일간 사용 가능)
- 한 사람 당 하나의 아이디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이벤트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벤트 기간 내 대상 도서 다운로드를 완료해야 참여됩니다.
- 본 이벤트는 예고없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10월의 시집
-
우리는 멀어지는 사이를 메우기 위해
계속 말을 했다
말은 떠다니고
그러다
너는 박차고 일어나
걸어 나가고
말이 끝나면 정말 끝이 날까봐
나는 계속 말을 했다우리는 이어져 있다고 믿어
부스러지고 깨어진 세계를 메우는 회복의 언어
끝없는 고통과 폭력의 구조 위에 섬세한 회복의 언어를 직조해내는 손미 시인의 세번째 시집. 이번 시집 역시 녹록지 않은 세계 속에서도 타인과의 연결을 도모해보려는 노력의 과정을 담았다. 그 연결은 비록 매끈한 접합이 아니라 쓰라리고 불편한 흉터를 남기는 봉합에 가까울지라도, 갖가지 ‘너’와 ‘나’의 만남이 축조해낸 거친 구조물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9월의 시집
-
여름이 오고 다시 같은 기억으로 괴로워하다가 여름으로 버려질 테고 거의 정지 화면처럼 한없이 느리게 여름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겠지 여름의 모양을 따라 또 함께 걷고 싶었던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겠지 나는 여름을 다 살지도 못한 채 여름의 폐허만을 사랑한 채
작약은 물속에서 더 환한데
식물과 손잡고 슬픔이라는 물속으로 침잠해가는 우리들의 여름
생명력이 느껴지는 부드러운 식물의 이미지와 섬약하고 민감한 감정이 만나는 순간 발생하는 감정의 울림, 요컨대 여름과 식물과 슬픔이 한자리에 모여드는 바로 그 순간을 이승희 시인은 차분하고 깊은 언어로 담아낸다. 마치 여름이 오고 가듯 자연스러운 속도와 방식으로.
8월의 시집
-
어떤 물은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녹아 물이 되듯이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오래 간직해야지 하는 생각수옥
박소란의 조용한 위로
이 시대가 사랑하는 감수성,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위로의 언어, 박소란 신작 시집. 세상의 바닥을 어루만지며 슬프고 아픈 이야기를 통해 역설적으로 위로를 건네던 시인은, 이제 자신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따뜻하게 보듬기 시작했다. 그 따뜻함이 물처럼 구슬처럼 흐르고 또 머무른다.
둘러앉은 이들 사이에서 혼자 몰래 빠져나가 조용히 흐느끼는 사람의 뒷모습이 신경 쓰여 “내가 다 잘못했어요/말하고 싶어”(「수」)하는 모습처럼.
7월의 시집
-
나는 너의 왼팔을 가져다 엉터리 한의사처럼 진맥을 짚는다. 나는 이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 같아. 이 소리는 후시녹음도 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계속 걷자. 당근의 비밀을 함께 듣자. 펼쳐진 것과 펼쳐질 것들 사이에서, 물잔을 건네는 마음으로.
당근밭 걷기
<여름 언덕~> 안희연 신작 시집
슬픔도 결핍도 정면으로 마주하며 섬세하고 정확한 문장으로 담아내는 안희연 시인 신작 시집.
시인은 “한 사람을 구하는 일은 / 한 사람 안에 포개진 두 사람을 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고. 나를 구하는 것은 너를 구하는 것이며, 너를 구하는 것은 나를 구하는 일이라고. 우리 모두 함께 구하러 가자 말한다.
그렇게 빛 쪽으로 한 걸음 더 내딛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행간에 가득 담았다.
6월의 시집
5월의 시집
-
이번엔 시가 나를 ‘새하게’ 했다.
그런 다음 나를 날지 못하게 하고, 날개를 꺾었다.
그러므로 이 시집은 책은 아니지만
새하는 순서.
그 순서의 기록.날개 환상통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수상
등단 40년이 되는 해에 펴낸 김혜순의 13번째 시집. 이번엔 작별의 자리에서 ‘새하기’를 통해 주체와 객체의 경계를 허물고, 젠더와 상징질서의 구획을 돌파한다.
‘새하다’라는 말은 언뜻 자연스럽지 못하게 들린다. 그러나 ‘새’의 위치가 주어도 목적어도 될 수 없거나 혹은 둘 다 될 수 있는 이 모호함이 이 문장을 시적인 것으로 만든다. 문법적인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인간과 동물의 위계를 지워버리는 이 강력하고 매혹적인 수행문은 시집을 관통하는 동력 장치이다.
김혜순은 새의 실체를 재현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는 이 시집을 새가 태어나는 리듬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삼는다. “‘새하다’는 참과 거짓, 진실과 허구 같은 경계를 넘어서는 수행적 사건”이며, 이는 시의 뒷부분에 이르러 ‘내’가 ‘나’를 뿌리치는 행위와 연관된다. 그렇게 그는 여전히 ‘새하며’ ‘시한다’.
4월의 시집
-
목표는 있으나,
길은 없다.
우리가 길이라고 부르는 것은,
망설임이다.우리가 길이라 부르는 망설임
프란츠 카프카 사후 100주년 기념
시 116편과 드로잉 60개를 수록한 국내 최초 카프카 드로잉 시전집. 한독문학번역상 수상자인 편영수 교수의 번역을 더했다. 1부는 고독, 2부는 불안, 불행, 슬픔, 고통, 공포, 3부는 덧없음, 4부는 저항, 그리고 5부는 자유와 행복의 모티프를 중심으로 묶었다.
카프카는 시와 산문을 구분하지 않고자 했다. 그는 동일한 텍스트를 산문으로도 쓰고 행과 연으로 구분해서 시로도 쓰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프카가 시 형식을 사용한 건 “시가 아주 적은 단어들로 하나의 세계를 감정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예술이기” 때문이다.
시와 산문, 언어로는 미처 다 전달하지 못하는 답답함은 드로잉으로 표현했다. 낙서 형식인 그의 드로잉들은 단순한 터치들이지만 전통적인 비율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흐르며, 동적인 묘사를 통해 상황과 감정 상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3월의 시집
-
“이 시 좋네요. 자작시예요?”
나는 짐짓 모른 척하고 말을 붙였다.
“아니요. 누가 이런 좋은 시가 있다고 보내줬어요. 나한테 딱 어울리는 시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고 매일 읽어봅니다. 나도 구두를 닦을 때마다 별을 닦는다고 생각하면 은근히 마음이 좋아져요.”
나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져 자칫 내가 쓴 시라고 말할 뻔했다.고통 없는 사랑은 없다
정호승의 시가 있는 산문집
등단 50년을 넘긴 한국 서정시의 거장 정호승 시인이 직접 가려 뽑은 시 68편, 그 시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낸 산문 68편을 한데 묶은 ‘시가 있는 산문집'.
〈우리가 어느 별에서〉 〈슬픔이 기쁨에게〉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 등 시인의 대표 시가 다수 수록되었으며, 시를 창작할 당시의 사연을 풀어낸 산문들이 짝지어 펼쳐진다.
2월의 시집
-
선생님도 모르겠죠
표정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창작수업」中정신머리
제42회 김수영 문학상 수상작
시를 왜 쓰냐고 물어보면 “내 깡패 되려고 그렇소.”라고 답하겠다는 수상 소감처럼, 시인은 유산을 상속받는 동시에 그에 들러붙은 규칙과 규율을 모조리 폐기하고 오롯이 제 것으로 삼는다. 있던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 지어 올린 다음 다시 무너뜨리며 이 상속과 폐기를 영원히 반복한다. 과거를 답습하는 대신 오류를 남발하는 방식으로, 과거와 화해하는 대신 영원히 들러붙어 싸우는 방식으로 과거를, 우리가 사랑하는 죽은 것들을 되살려낸다.
이와 동시에 시인은 집이자 감옥이 되어 버린 이 세상을 영원히 함께 배회해 보자고 말한다. 저주하면서, 그러나 꿈꾸고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면서.
1월의 시집
-
그대의 한 걸음은 새로운 인간들의 소집이고 이들의 전진이다. 그대가 고개를 돌리면, 새로운 사랑! 그대가 고개를 다시 돌리면, ─ 새로운 사랑
일뤼미나시옹
천재 시인 랭보의 미완성 산문 시 × 입체주의 회화의 거장 페르낭 레제
고대의 전설이나 신화에서 시작해 현대적 사건에 이르기까지. 시공을 초월해 세상의 끝에 닿으려는 랭보의 흔적들.
얼핏 기이하고 난해하게 보이지만 행, 단어, 문장부호들을 하나씩 곱씹다 보면 그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랭보의 문장들에 레제의 대담한 색채와 역동적인 선이 어우러져 보다 감각적으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집.
느낌을 넘어 더 깊게 들여다보고 싶은 독자들을 위해 꼼꼼하고 상세한 옮긴이의 해제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